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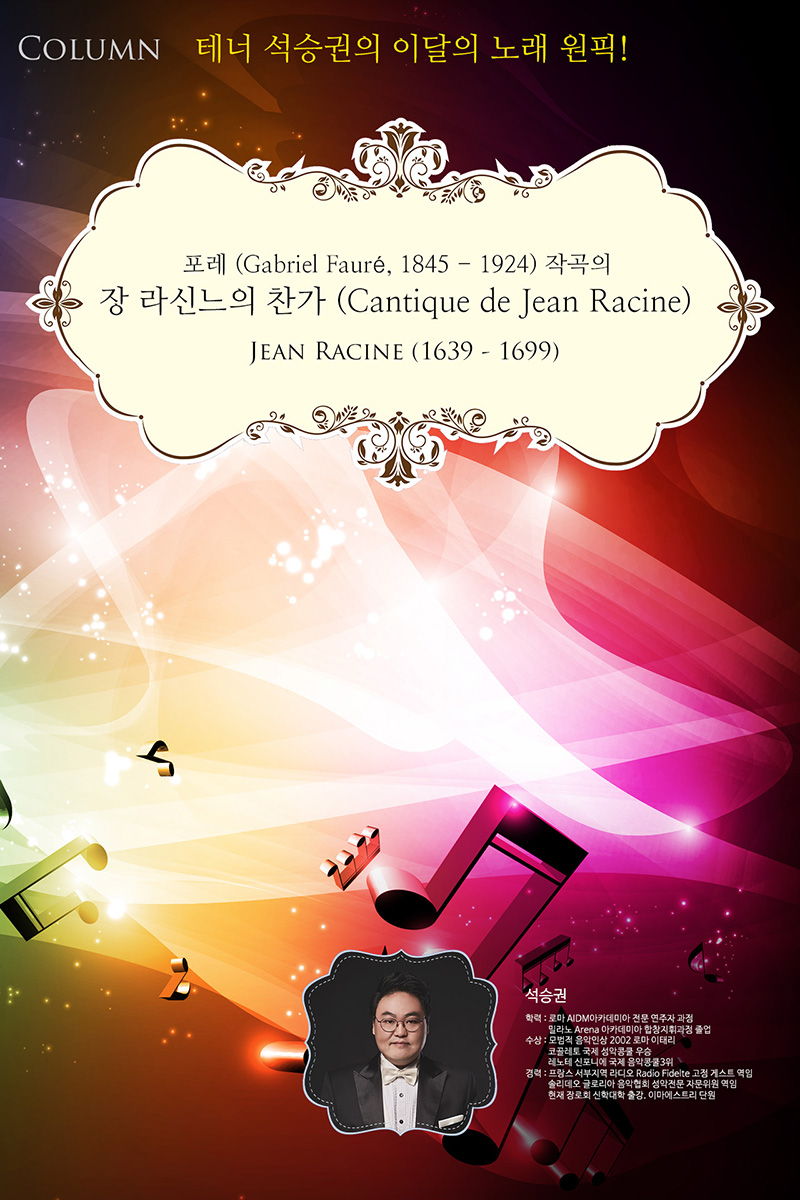 |
|
테너 석승권의 이달의 노래 원픽
포레 (Gabriel Fauré, 1845 - 1924) 작곡의 장 라신느의 찬가 (Cantique de Jean Racine)
- Jean Racine (1639 - 1699)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유럽 (이탈리아와 프랑스) 에서 보냈다.
가톨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으로 7년, 개신교의 목숨이 허락받은 낭트 칙령 (L’édit de Nantes) 1598년 4월 13일에 앙리 4세가 선포한 칙령으로 프랑스 내에서 가톨릭 이외에도 칼뱅주의 개신교 교파인 위그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프랑스 낭트에서 5년 가득을 보냈으니, 대대로 개신교 성직자 가정에서 자란 나는 유럽에서의 삶이, 나의 가족의 궤적과 다른 로마가톨릭과, 개신교의 보호소 같았던 프랑스 낭트에서의 개신교를 돌아보는것이 나름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유학시절 그 곳 젊은 학생들에게 받은 충격들 중 하나의 일이다.
우리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온 사람들인지라, 이미 국립음악원을 다니고있는 현지 학생들과는 최소한 대여섯살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니, 음악원을 다니던 현지 이탈리아 학생들은 마치 나의 대학시절을 보는 듯 한 삶들이었다.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뭉쳐다니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활기찬 20 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 중 커플들도 몇 있었는데, 한 커플이 학교 수업 마치고 나가길래 “어디가?” 하고 물었더니, “미술관!” 이라는 것이었다.
매일 까불거리고, 헤헤거리던 커플이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미술관” 이라는 단어가 왜 그리 생소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당시 연애중이던 필자 본인 조차도 즐겨가는 미술관이었는데 말이다.
참고로, 필자가 다닌 국립음악원은 로마 가장 한가운데 있었고, 그 주위는 미술관과 유물들이 가득한 곳이어서 아마도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나의 편견이었다.
그 일 이후로 많은 생각이 변했다.
사실 우리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궁에 들어가거나, 미술관, 박물관에 잘 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연인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고궁과 박물관, 미술관 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또, 우리는 학습을 통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우리 개인의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학교 교수님들과의 수업에 관한 토론의 방향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음악을 공부하러 간, 그 나라 그 학교였지만, 서유럽 문화의 기본인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서유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개신교도들이 아닌이상 종교개혁에 관한 관심은 그다지 없을 것 같지만, 서유럽 문화를 이해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될 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이야기를 꺼내본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서유럽의 기독교 (가톨릭) 보편적인, 공통적인의 의미인 그리스어 ‘카톨리코스’ 에서 유래했으며, 보편적 교회의 전통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사용되던 단어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로 떨어져 나간 이후에 자신들은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로마가톨릭교회가 가톨릭 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는 왕권보다도 위에 존재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었으며, 그로인해 신권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차마 해서는 안될 일들도 자행했다.
이미 교회 자체가 분열하였고, 성직자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으니,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대리석을 콜로세움에서 2522 개를 뜯어왔고,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보니 사후에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의 발행과 판매를 자행했다.
사실 면죄권은 그 전에부터 자행되었으며,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 때 전쟁을 다녀온 군사들에게 교황 우르반 2세는 모든 죄의 징벌을 면제해주겠다고 선언했고,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마련하기위해 귀족들과 돈많은 부자 상인들의 돈을 거두어가면서 그들의 죄도 면죄 해 주었다. 이런식으로 교황의 면죄권이 돈과 결부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교회의 부패 속에서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서방교회의 정치 참여와, 면죄부 판매, 연옥에대한 이슈 등을 쟁점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직 성경의 권위,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 으로 그 사상을 정리 할 수 있다.
그의 95 개조 반박문은 그 당시 발명된 인쇄술의 도움으로 쉽게 출판물로 출판되어 퍼져갈 수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을 꼽을 때 세 사람의 이름을 꼽는다. 독일의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83 - 1546), 프랑스 출신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장 칼뱅 (Jean Calvin Jean Calvin 의 실제 이름의 발음은 졍 꺌방 이다.
, 1509 - 1564), 스위스 취리히의 울드리히 츠빙글리 (Huldrych Zwingli, 1484 - 1531) 를 이야기 하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체코의 얀 후스 (Jan Hus, 1372 - 1415), 프랑스 리옹에서 시작해 현재 이탈리아에 가장 큰 거점을 가진 발도파 교회의 피터 발도 (Peter Waldo, c.1140 - c.1205) 등을 들 수 있다.
음악적인 관점에서 위에 꼽은 세 사람을 보자면, 루터는 교회의 음악의 전면수용의 관점을 가졌고, 더 나아가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부르던 가곡, 가요 내지는 민요의 가락에 신앙의 가사를 얹어서 부르게까지 했다. 루터교 작곡가중 가장 유명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1685 - 1750) 은 그의 최고의 수난곡인 마태수난곡에 우리도 잘 아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라는 곡을, 한스 레오 하슬러 (Hans Leo Hassler, 1564 - 1612) 작곡의 가곡 “내 마음 나도 몰라 Mein Gemut ist mir verwirret” 에 가사만 바꾼 곡이다.
반면에 칼뱅은 교회 공예배에서는 시편만을 부를 수 있도록 했고, 전 시편에 곡을 붙여 시편가 라는 찬송집을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음악적 조예가 깊어서 각종 악기도 다룰 줄 알았고, 음악가와의 깊은 친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의 공중 예배 안에서 만큼은 음악에 가장 폐쇄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로마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해 나간 개신교를 마주한 로마가톨릭교회는 그들 안에서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반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재정비의 운동이 일어난다.
이탈리아 북부의 ‘트렌토’ (Trento) 에서 모인 이 회의는 18 년 동안 세번에 걸쳐 길게는 3 년, 짧게는 2 년동안 이어 회의를 했다. 특별히 종교개혁으로 어지러워진 로마가톨릭의 의미를 재정립한것이 중요하며, 거의 전체적인 교리, 행정, 미사, 서품에관한 거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여 확립했다는것이 중요하다. 그 중, 무엇이 이단인가를 정리하면서 특히 개신교라 부르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이단으로 정의 했는데, 그 근거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라고 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로마가톨릭은 성경과 사도들의 좋은 전승을 따르는 전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 서유럽에 큰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개신교의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다시한번 유럽에 큰 폭력의 바람이 불었던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후 로마가톨릭에도 세속을 멀리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수도회가 여럿 생겨났는데, 남자 수도자를 수사, 여자 수도자를 수녀 라고 부르며, 수사들 중 서품을 받은 정직수사와 그렇지 않은 평수사가 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여자들에게 서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중심이 되는 수도회 몇 곳을 꼽자면, 예수회, 프란치스코회, 베네딕토회, 살레시오회를 들 수 있다.
그 당시 존재했던 수도회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은 누가뭐래도 예수회 (Societas Iesu) 인데, 이 수도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엄밀한 학문과 사도적 열성으로 유명하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영화 미션으로도 유명하여 이 영화를 통해 예수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던 얀센파가 있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르넬리우스 오토 얀센 (Cornelius Otto Jansen, 1585 - 1638) 은 우리가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중요하며, 인간의 구원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로마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예수회의 입김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게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장 칼뱅의 장로교의 교리와 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얀센이 칼뱅의 교리를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얀센파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포르 루아이얄 수도원 (L’abbaye de Port-Royal) 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팡세 (Pensées) 로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 (Blaise Pasca, 1623 - 1662), 테데움 (Te Deum) 으로 유명한 마크 앙투안 샤르팡티에 (Marc-Antoine Charpentier, 1643 - 1704) 가 얀센파였던것이 유명하다.
1642 년 황 우르바누스 8세에게 이단으로 선고받은 후, 그 이름은 사라지고 단체가 있었던 장소만 유물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교리는 프랑스 가톨릭 교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것을 알 수 있다.
* * *